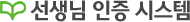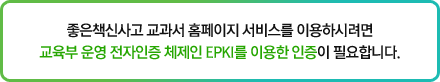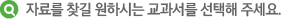|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 말라위(Malawi)에서 나는 18살 소년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모세 니렌다(Moses Nyrenda).
"I like walkman please send to me as gift from Kim"
모세로부터 메모를 받은 건 처음 그를 만나 10분도 채 안된 시간이었다. 치팀바(Chitimba) 해변에서 소년은 직접 만든 구리 팔찌를 팔기위해 동생을 앞세워 내게 접근했다. 그러나 나는 소년의 팔찌를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팔찌 2개에 1달러 달라고 할 거지? 미안해, 어제 충분히 샀거든.”
몇 마디 대화가 오갔을 때 불쑥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소년의 표정은 특별히 무겁거나 진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좀 의아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워크맨을 선물 받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고는 어디서 온 것일까?
“헤이 킴. 워크맨이 뭔지는 알죠? 난 워크맨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에요.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가난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을 걸요. 만약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 내게 워크맨을 보내준다면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세는 ‘만약’과 ‘너무너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도취한 듯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였는데 그의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워크맨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모세, 너 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알아?”
나는 모래밭에 세계지도를 그려놓고 말라위와 대한민국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그리며 물었다.
그럼요. 축구 잘하고 월드컵 치른 부자나라잖아요.”
다음 날 해변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워크맨 뿐이었다. 그는 항상 웃고 명랑했지만 표정에는 어떤 음모나 기분 나쁜 배후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세를 좋아하고 있었다.
“모세, 우리 워크맨 구경하러 갈까?”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 몇 번 더 그를 만났고 결국 나는 중고 워크맨을 선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자 여깄다. 김의 선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첫째는 한국을 기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 실컷 듣고 워크맨보다 좀더 큰 꿈을 가지는 거야, 알았지?”
모세와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워크맨을 손에 쥔 모세는 행복감을 감추지 못해 이어폰을 귀에 걸고 깃털처럼 가볍게 겅중겅중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마에 맺힌 땀이 뜨거운 태양에 번들거렸다.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워크맨을 들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라니! 나는 너무나 행복해 하는 모세의 표정을 보며 전율했다.
내게도 그처럼 작은 것 하나 갖는 것이 꿈일 때가 있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조차도 꿈꿀 수 없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프리카에 갔고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나 그의 꿈과 동시에 내 꿈도 이루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이들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팜 열매를 먹을 때 궁금해서 물었다.
“그거 원숭이 밥인데 왜 먹어?”
답은 간단했다.
“원숭이가 먹으니 우리도 먹어요.”
아프리카에서 동물과 사람은 다르지 않다. 신발 신은 아이를 거의 보지 못했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인지 그들은 불행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했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원숭이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언제나 ‘하쿠나 마타타(걱정 마, 다 잘 될 거야)’다.
돌아와 배낭을 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인내와 낙천성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온 감사, 이 많은 것들은 내가 배낭에 넣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알아서 나누어 준 것들이다. 나는 또 새로운 꿈을 꾼다. 아프리카보다 좀더 멀고 아름다운 세상을.
김인자(시인, 여행가 isibada@naver.co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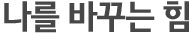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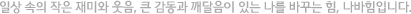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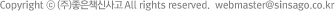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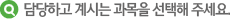



 미설정
미설정